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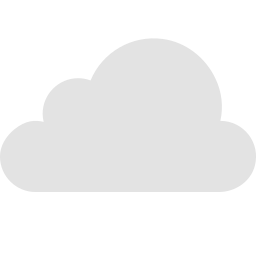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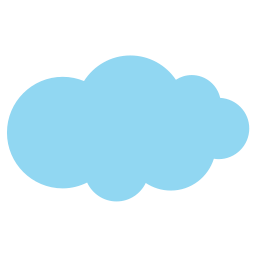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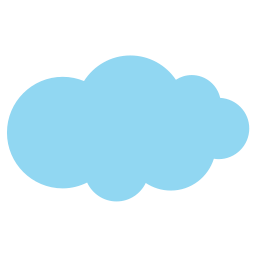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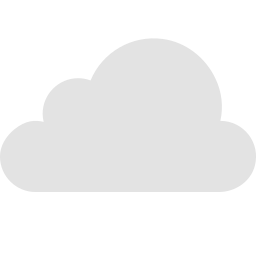


전설e님의 로그
바람이 분다. 그대 오는 소리.-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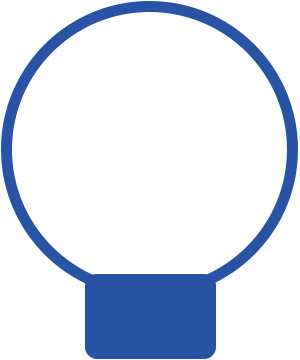 19
19
-
 나 어때
나 어때♡전설e(@5004ace)

- 35 팔로워
- 11 팔로잉
- 소속 방송국 없음
-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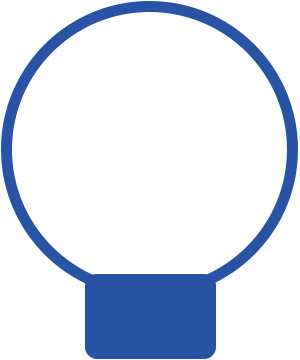 19
19 ♡전설e (@5004ace)2024-09-24 23:04
♡전설e (@5004ace)2024-09-24 23:04
대전 mbc 창사 60주년 기념 특집방송 초대에 선물로 ~~~~~!!!
가을,
가을한 9월 23일댓글 0
-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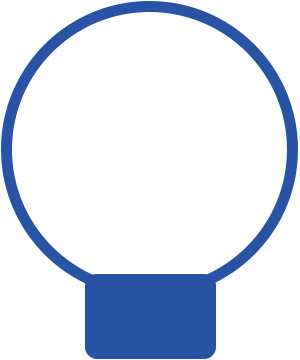 19
19 ♡전설e (@5004ace)2024-09-05 22:37
♡전설e (@5004ace)2024-09-05 22:37
마음이 울적할 때는 산에 올라야 한다.
치열하게 지지고 볶았던 세상이
성냥갑 하나처럼 보일 때
그 속에서 내가 있었음을 안다.
그래도 마음이 우울할 때는 시장에 가야 한다.
사람과 사람 사이
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속에
또 하나의 내가 있었음을 알기에.
그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
비로소 나는 꽃이 되었다는
어느 시인의 말처럼,
그대 있음에 내가 있음을 깨달은 오후
나는,
가을이다.
- 2024년 9월 5일 전설e 의 일기 중에서댓글 0
-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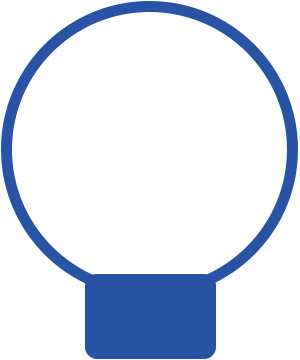 19
19 ♡전설e (@5004ace)2024-09-03 21:09
♡전설e (@5004ace)2024-09-03 21:09
어느 겨울에 쓴 일기
원고지를 열었다.
바를 정(正)자로 곧게 정렬된 네모 칸이
누군가를 가둬 둔 창살만 같아 그만 접고 말았다.
그 대신 하얀 종이를 열었다.
어느 해 겨울,
밤새 눈이 내려 온 세상이 백지로 변한 아침
소복히 쌓인 눈 사이에 하나 둘 찍힌
발자국.
한참을 바라보았다.
그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간 것일까.
어쩌면,
아무도 모를 눈물 한방울
가슴에 꼬옥 꼭 보듬고
아직은 멀기만 한 봄날을 향해
먼 길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.
그가 쓴 한 줄의 시가
평생 모아서 일구었던 재산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다고 말한
길상사 여인,
김영한의 가슴 시린 한마디,
어줍짢은 내 글이
누군가의 눈에 들어와 봄비가 되고
꽃이 될 수 있다면 그 뿐.
비가 내린다.
저 비가 그치면 하나 둘
겨울로 향해 떠나는 것들이 참 많을 것이다.
그해 어느 겨울,
하얀 백지 위에 쓰다 만 편지 한 줄이
오래토록 가슴에 남아
빈 바람 소리로 남아
긴 긴 겨울 밤
나를 또 울린다.
"내게 아직 봄은 멀기만 하다.
그대 아직 내게 오지 않았음으로......."댓글 0
-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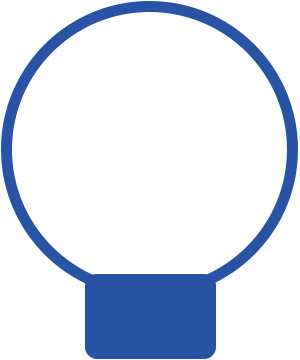 19
19 ♡전설e (@5004ace)2024-09-02 08:07
♡전설e (@5004ace)2024-09-02 08:07
가을의 길목에서.....
길
두 갈래 길에 서서
한참을 서성였다.
살아가는 동안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고
그 길을 걷다보면
가지 않은 길에 미련을 두기 마련.
그대는 아는 지
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
먼 훗날
아름다운 꽃길이 아니었더라도
가지 않은 길 보다 후회스런 길이 아니었기를,
나는, 소망한다.
무언가 담기 위해서는
쉼 없이 비우고 또 비워야 한다는 걸.
비워 둔 그 자리에
하늘의 별과 달,
그리고 바람의 소리까지 오롯이 담은
노을빛 연가이길...
또 다시 찾아 온 가을의 길목에 서면
붉은 노을이 선다.
시린 그대 가슴에......댓글 0
-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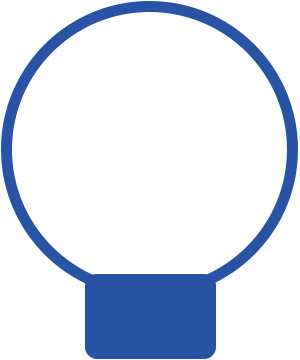 19
19 ♡전설e (@5004ace)2024-08-04 21:11
♡전설e (@5004ace)2024-08-04 21:11
**
저희 집 어머니는 올해로 80하고도 8년의 세월을 건너오신 분입니다.
어느 누구나 그러하듯
어머니에게 있어 아들은 늘 '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'인 모양입니다.
지난 주말,
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마친 후
어머님 댁에 들러 하룻밤을 잤습니다.
코로나에 뇌경색, 급성 심근경색 등
속칭 '종합병원' 그 자체였던 저희 어머니는 숱한 고비를 넘기고
아직까지도 하루 일당 2만원(?) 주는
마른고추 선별하는 동네 작업장에 출근하십니다.
몇 번을 말렸지만, "놀면 더 아프다"는 핑계에 더는 할 말이 없어
6남매 모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.
예고없이 방문한 둘째 아들에게
아침밥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고 출근길(?) 서두르는 어머니.
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 본 제 마음 또한 편하진 않았지요.
그런 어머니를 뒤로 하고
지갑을 열어보니 10만원 남짓,
평소 어머니가 자주 쓰시는 전화기 밑에 넣어두고
귀갓길을 서둘렀습니다.
어스름 저녁 나절, 일을 마치고 돌아 온 전화 한 통.
"아니,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매번 이렇게 놓고 가냐? 아침도 제대로 차려주지 못해서 미안한데....
아들,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. 남자는 자고로 밥심으로 사는 겨~~~~~~~"
잔소리 아닌 잔소리에 이력이 난 저는 슬그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.
엄마와 딸은 몰라도,
엄마와 아들 사이에 긴 수다가 없습니다.
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?
문상가기 전, 양말과 속옷 등 급하게 꾸린 가방을 푸는 순간
툭, 떨어진 봉투 하나.
"어라~~~~~~ 이게 뭐지???? 내가 언제 비상금을 여기에 뒀었나?"
꼬깃한 봉투 안에 들어 있는 신사임당 석 장.
엄마가 아들 몰래 넣어둔 것이었습니다.
"멀리 가려면 기름이라도 넣어야지? 4월 13일이 너의 둘 결혼기념일 맞지???
애미하고 밥이라도 한 끼 먹으라고 조금 넣었다. 그리 알고~~~~~~"
이번에는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.
먹먹한 마음에 저는 한참동안
수화기를 쳐다보며 말을 잊었습니다.
................
꼬깃한 지폐 석 장
수화기 너머로 전해온 짧은 몇 마디.
그것은 (중략)댓글 0
-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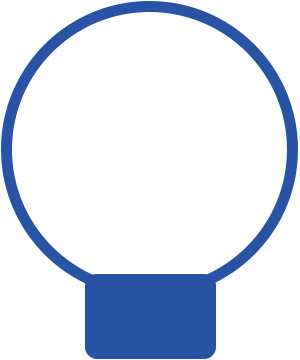 19
19 ♡전설e (@5004ace)2024-07-27 11:41
♡전설e (@5004ace)2024-07-27 11:41
‘엄마’라는, 그 이름 하나로 /전설e
“아들~~~ 밥은 먹은 겨?”
“내 그럴 줄 알았어~~~~~~~~ 김 여사님,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 있나요?”
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.
차가 많이 밀려서 힘들겠다고,
너무 힘들면 오지 말라고~
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팔십 육세 어머니는
어느 시인보다도 비유법과 은유법이 넘쳐났던 여인입니다.
힘들면 오지 말라면서도
떡 하고 기름 짜고, 그도 모자라
아들이 좋아라하는 고등어 구이에 육개장까지.........
뇌경색에 심근경색, S자로 굽어버린 등뼈도 모자라
대나무 마디처럼 굳어버린 손마디 마디.
이제는 그 모습조차 보기 어려운 구비를 넘기시고 구십 줄 바라보시는 당신.
머리와 허리, 하지 동맥 경화증으로
날이 갈수록 굳어만 가는 당신은
말 그대로 ‘종합병원’입니다.
그래요, 자식에 대한 ‘내리 사랑’은 있어도
부모를 향한 ‘치 사랑’은 없는 세월.
인생을 낙엽 지우며 꽃 피울 아들 딸
어루시던 손길
밭 일에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는 빨래거리
1년 365일 손등에 물 마를 새 없이 달려오며
어머니는,
또 어떤 강을 건너셨을까요?
이젠 그 자식들도 누군가의 애미가 되고 애비가 된 나이.
당신의 모진 세월도 한 세월을 건너가서
다시 꽃 피게 되는 날
저는 그것을 그리움이라 쓰고
사랑이라고 읽어 봅니다.
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
그 이름 하나 있어
나지막한 목소리로 불러 보는 그 이름 하나.
‘엄....마...’.댓글 0
-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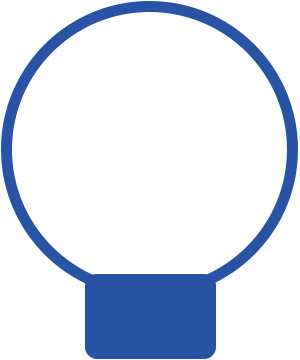 19
19 ♡전설e (@5004ace)2024-07-26 17:44
♡전설e (@5004ace)2024-07-26 17:44
오늘 하루
찌는 듯한 더위 속에
한바탕 소낙비가 내렸습니다.
그대와 나의 만남이 그러했듯
눈비 맞으며 함께 걸어왔던 길.
봄날의 추억은 책갈피 한 켠에 고이 묻어두고
휘엉청 달 밝은 밤에 몰래 꺼내보면
예쁜 꽃물 하나 들었을까요?
그래요.
어쩌면 우리는.....
지는 저녁놀을 바라보며
말없는 독백으로 한 마디 건네지 않아도
고개 끄덕일 수 있는
그런 인연이었기를 바래 봅니다.
"여기까지 잘 왔어. 함께 걷는 이 길
참, 고마운 그대였다고................."댓글 0
-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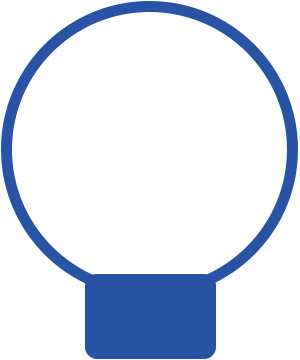 19
19 ♡전설e (@5004ace)2024-06-23 21:07
♡전설e (@5004ace)2024-06-23 21:07
전설e의 편지
한 아이가 있었습니다.
반벙어리 1년
귀머거리 1년
눈치코치도 없는 그 소년이 인터넷이라는 바다에
발을 디디기 시작한 것.
익명의 공간에서도
기다림과 그리움, 사랑과 이별이 있었다는 사실,
뜬금없이 팔순 어머니의 당부가 생각납니다.
“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. 애비야, 말수를 줄여라.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.”
그 말씀이 곧, 60줄 접어든 아들을 위해
당신이 전하는 말씀이자 사랑이었음을 압니다.
회자정리
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겠지만
적어도 꽃 한송이 피우고 싶었습니다.
아니, 아니, 꽃은 못 피우더라도
꽃씨 하나 품고 싶었습니다.
만나적이 없기에 헤어질 것도 없다는
법정 스님의 말씀처럼
저는 오늘, 또 다시 길을 떠납니다.
웃고 울고 하기를 몇 날
눈물로 얼룩진 삐에로와 같았던 제 이름은 전설입니다.
‘곡예사의 첫 사랑’을 좋아라했고
어머님이 좋아하셨던 ‘섬마을 선생님’도 젓가락 장단으로 잘 들었습니다.
이 모든 것을 모두 모두어
일기장 아래 꼬옥 꼭 묻어두면
어느 가을 날,
예쁜 단풍잎 하나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
어눌하기만 했던 그 소년.
이름 하나는 기억해 주길 바라며..............
.............
가시나무 / 소향
1994년 어느 늦은 밤 / 장예진댓글 0
-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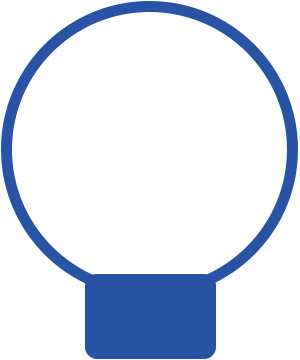 19
19 ♡전설e (@5004ace)2024-06-09 04:07
♡전설e (@5004ace)2024-06-09 04:07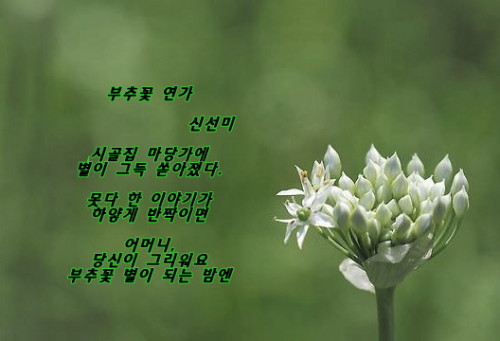
부추꽃
별이 되는 밤.
보고 싶다는 말조차 잃어버린
그대 이름은
엄
마댓글 0
-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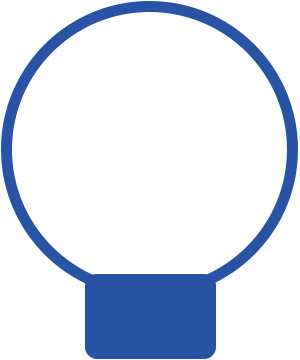 19
19 ♡전설e (@5004ace)2024-06-06 15:21
♡전설e (@5004ace)2024-06-06 15:21
아버지를 추억하며
강물 같은 그리움을 담아
불러보는 그 이름
아버지
당신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게 자란
현충일
조용히 두 곡
그대의 머리맡에 드립니다
1. 향수
2. 아버지 / 박강수댓글 0
- 쪽지보내기
- 로그방문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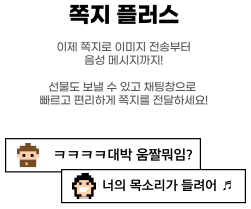
 개
개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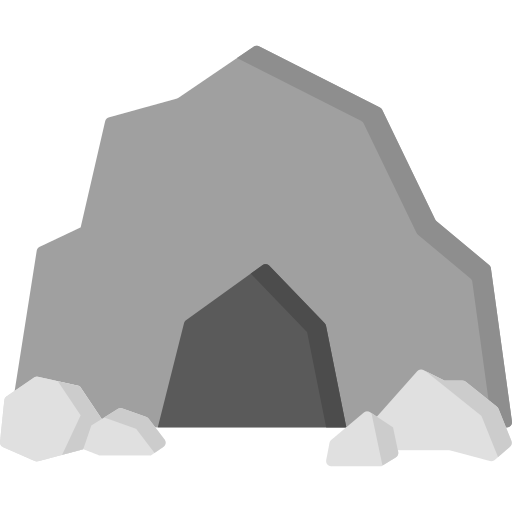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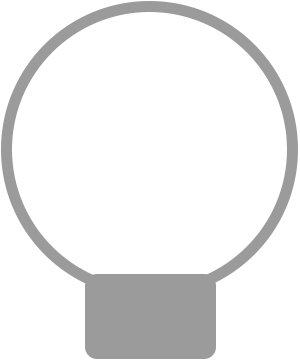

 젤리 담아 보내기 개
젤리 담아 보내기 개 로즈 담아 보내기 개
로즈 담아 보내기 개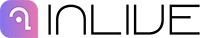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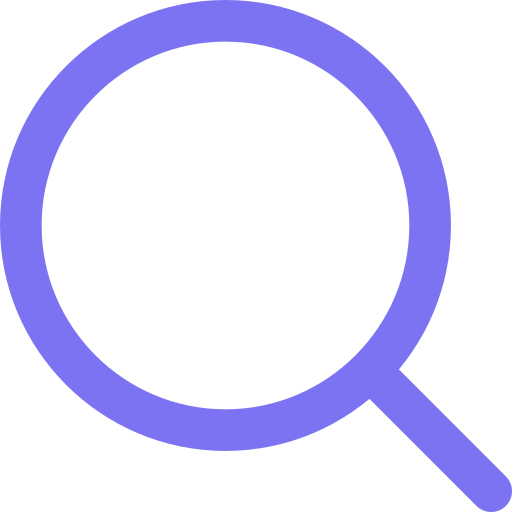





 0
0 신고
신고